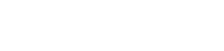전설과 사화
여나산곡
두동면 은편리와 언양읍 대곡리 사이에 있는 연화산(蓮花山 : 531m)을 옛날에는 여나산(餘那山)이라 하였다.
고려 때에 어떤 서생(書生 : 선비)이 여나산 기슭에 외롭게 살고 있었다. 그는 부지런히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 서생은 과거에 급제한 영광으로 큰 세족(世族)의 규수를 맞아 혼인을 하였다. 또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 누진하여 뒤에는 과거의 장시(掌試 : 시험을 관장함)를 맡아 보게까지 이르렀다. 고려 때 관계(官界)의 풍조는 과거의 시험관인 장시가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풍조는 과거가 끝난 뒤에 급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배(謝拜)의 예를 행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다.
여나산의 서생이었던 그에게도 예외없이 급제자들이 찾아와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때에 그 혼가에서는 영광된 기쁨에 넘쳐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의 일이었다.
장시자(掌試者)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는 이 노래를 먼저 부르는 관례가 생겨나게 되었다. 또 그 노래의 이름을 여나산곡(餘那山曲)이라 하였으나 가사와 곡은 전하지 않는다.「고려사」악지(樂志)에 나타난다.
가슬갑사
귀산(貴山)은 신라의 사량부(沙梁部) 사람으로 화랑출신이었다. 그는 어릴적에 같은 부의 사람인 추항과는 친한 친구사이였다. 하루는 두 사람이 서로 이르기를「우리들이 꼭 사군자(士君子)와 더불어 놀아야 하겠으며 먼저 정심수신(正心修身)하지 않으면 아마 욕됨을 면치 못할지도 모르겠다. 어진이 곁에 나아가서 도(道)를 묻지 아니하려는가?」하였다.
때는 마침 수(隋)나라로 들어가 유학하고 있던 원광법사(圓光法師)가 진평왕(眞平王) 22년(600)에 조빙사(朝聘使) 나마(奈麻 : 벼슬이름) 제문(諸文)과 대사(大舍 : 벼슬이름)을 따라 돌아와서 가실사(加悉寺 : 운문사 부근)에 있었는데 그 때 사람들의 높은 예우를 받고 있었다.
귀산 등이 그의 문하(門下)로 공손히 나아가 말하기를「저희들 속사(俗士)가 어리석고 몽매하여 아는 바가 없사오니 종신토록 계명(誡命)을 삼을 한 말씀을 주시기 바라나이다.」고 하였다. 법사가 말하되「불계(佛戒)에는 보살계(菩薩戒)가 있는데 그 종목이 열가지이다. 너희들이 남의 신하로서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첫째는 임금 섬기기를 충으로써 하고(事君以忠), 둘째는 어버이 섬기기를 효로써 하고(事親以孝), 셋째는 친구 사귀기를 믿음으로써 하고(交友以信), 넷째는 전쟁에 임하면 물러서지 않고(臨戰無退), 다섯째는 생명 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한다(殺生有擇)는 것이다. 너희들은 실행에 옮겨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귀산(貴山) 등이「다른 것은 말씀대로 하겠는데, 다만 살생유택(殺生有擇)만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법사가 이에 답하여 말하기를「육재일(六齋日-불교에서 매월 8·14·15·23·29· 30일의 여섯 재계일)과 봄, 여름철에는 살생치 아니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때를 택하는 것이다. 또 부리는 가축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말, 소, 닭, 개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미물(微物)같은 하찮은 생물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고기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함이다. 이것들의 물건을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오직 소용되는 것에 있어 많이 죽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이 가히 세속의 선계(善戒)라 할 것이다.」하였다. 귀산 등이「반드시 행하여 감히 실수하지 않겠습니다.」하였다.
이로부터 2년 뒤인 진평왕 24년(602) 8월 백제와의 아막성(阿莫城 - 전북 南原市 雲峰邑)전투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귀산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내가 일찍 스승에게 들으니 선비는 전쟁에 있어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찌 감히 달아날까 보냐.」하고 적에게 돌진하여 적군 수십인을 격살하고 신라군을 승리로 이끌게 하고 추항과 함께 전사하여 세속오계를 몸소 실천했다. 이와같이 귀산 등이 세속오계를 원광법사로부터 받았다는 가실사(加悉寺)가 지금까지 청도(淸道)땅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근자에 와서 그 절이 울주군 상북면(上北面)쪽에 있었다는 설이 있어 이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삼국유사」의 원광서학(圓光西學)편을 보면 가실사(加悉寺)를 가슬갑(加瑟岬)이라 하였으며 이 절을 설명하여「혹은 가서(加西) 또는 가서(嘉西)라 하니 모두 방언이다. 갑(岬)은 속언에 고시(古尸-곳)라 하므로 혹은 고시사(古尸寺)라 하니 마치 갑사(岬寺)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운문사(雲門寺) 동쪽 9천보(步) 가량 되는 곳에 가서현(加西峴)이 있는데 혹 가슬현(嘉瑟峴)이라고 한다. 현(고개)의 북동(北東)에 절터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라 하였다. 또 읍지(邑誌)를 살펴보면 운문산(雲門山) 또는 운문재(雲門峴)를 일명 가슬현(嘉瑟峴)이라 하였고 가슬갑사(嘉瑟岬寺)는 가슬현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가슬갑사는 운문재의 상북(上北)쪽 땅에 있었음을 말함이니 유서깊은 절이라 할 것이다. 상북면 덕현리(德峴里) 삽재(揷峴) 마을은 그 훈(訓)이「곶재」로서「곳-古尸」바로 그것이다.
반구대 설화
언양읍 대곡리(大谷里)에는 경승지인 반구대가 있는데 연고산(蓮皐山 : 연화산)의 한 자락이 뻗어 내려와 이곳에 와서 우뚝 멎으면서 기암 괴석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마치 거북이 넙죽 엎드린 형상이므로 반구대(盤龜臺)라 한다. 두동면 천전계곡(川前溪谷)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옥류가 이 곳에 모여 호반을 형성하니 절승가경(絶勝佳景)으로 이름이 높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향 각처의 시인묵객들은 이 곳을 찾아 시영(詩詠)으로써 경관을 즐겼다고 한다. 반구대에 대하여 특기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고대 유목민의 생활 풍속도인 암면각화(巖面刻畵)가 1970년대 초에 발견되어 전 세계 인류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암면각화는 같은 수법으로 된 것이 소련 바이칼호에서 첫 번째로 발견된 후 이것이 두 번째로 발견된 희귀하고도 소중한 고대각화(古代刻畵)라고 한다. 이 각화는 고대의 북방유목민들이 지금부터 3천여년 이전에 이미 이곳으로 남하하여 생활했으며, 또 그와 같은 훌륭한 각화를 조각할 수 있으리 만큼 훌륭한 예술과 문화를 가진 유목민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신라 때는 화랑들이 명산대천(名山大川)을 찾아다니면서 고귀한 기상을 기르고 심신을 단련하던 때에, 이 곳에 와서 훈련하고 야영생활을 했으며, 또 고려 말의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조선 초기의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한강 정구(寒岡 鄭逑) 등 삼현이 이곳에서 명시를 남기고 향민들을 교화하였다. 그래서 반구(盤龜) 아래의 소구(小丘)인 포은대(圃隱臺)에는 이 삼현의 행적을 기록한 반고서원유허비와 포은대영모비가 세워져 있고 또 맞은편(시내 건너편)에는 중창한 반구서원이 있다.
그런데 울산공업단지가 설정된 후인 1960년대 중반 공업용수를 위하여 범서읍(凡西邑) 사연(泗淵)에다 반구천(盤龜川)의 하류를 막아 댐(사연댐)을 축조하자 집수(集水)로 수위가 높아져서 귀중한 암면각화가 수중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어쨌든 우리 고장에 이같이 유서깊고 귀중한 고고학적 자료가 있다는 것은 자랑할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중 하나는 현재 대곡리 山234-1번지 수중(水中)에 있으며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상류의 천변(두동면 천전리)에 있는데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몽주와요도의적소
요도(蓼島)는「헌양잡기(窟陽雜記)」에「在縣東一里 普通院下 卽田麓間一小丘也 處三水間故爲名, 定式流配罪人 十二而每人給 朔米三斗 後或倍給貽民弊」라 하였다. 요도(蓼島)는 감천(坎川 : 直洞川)과 남천(南川)이 합류하는 이수지간(二水之間)이라 하여 부른 이름이요, 요도(蓼島)가 적소(謫所 : 죄인이 귀양살이하던 곳)로 정해져 있는데, 적소의 건물이 어디였던가는 그 흔적이 없으나, 지금의 어음상리(於音上里) 마흘부락(馬屹部落)이다.
이 적소에 유배된 인사 중 가장 저명한 분 세 분을 들자면, 첫째 여말 충신 포은 정몽주가 배명친원(拜明親元)의 외교정책을 반대하다 우왕 2년(1376)부터 1년간 요도(蓼島)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둘째, 고려말 공민왕의 총신으로 우왕이 즉위하자 탄핵되어 언양으로 유배를 온 김홍경은「고려사절요」공민왕 4년(1355) 10월조에 김흥경(金興慶)이 유우언양 적기가(流于彦陽 籍其家)라 한 기록이 있으며, 세 번째가 조선조 숙종 때 청남(淸南)·탁남(濁南)의 당쟁에 몰려 갑술옥사(甲戌獄事 : 1694)에 연좌되어 요도(蓼島)로 유배온 시랑 남곡 권해(南谷 權?)가 있다. 1694년 3월에서 1697년까지 4년간 요도(蓼島)에서 기거하였다. 남곡 권시랑(南谷 權侍郞)은 대사헌, 형·호조참의(刑·戶曹參議)를 역임한 당대의 거유(巨儒)로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화장굴(花藏窟)과는 인연이 깊었다.
남곡은 번뇌가 심할 때마다 화장굴을 찾았으며, 유배 온 익년에는 가노 진(家奴 眞)을 시켜 비밀리에 모재(募財)하여 소암(小菴)을 지었다. 그러나 곧 대홍수로 인한 재화는 이 암굴(岩窟)에도 미쳤다. 다시 소암(小菴)을 일으키고 유생들과 함께 많은 시서(詩書)를 강론하였으며 언양지방에 숱한 시가(詩歌)를 남겨, 지금도 전하고 있다(註 : 언양지방에 전하고 있는 문헌에는 호가 남강(南岡)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그의 문집은「남곡집(南谷集)」이다).「읍지」에 실린 그의 작괘천, 반구대, 동헌, 석남사 시는 유명하다.
배리끝의 애화
옛날 언양에서 범서로 가는 산모롱이의 험한 층암절벽 길을「배리끝」또는「벼락띠미」라고 하였다. 반천리 살수(米淵)마을 동쪽 산 벼랑길이 곧 이곳인데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와 신설 국도로 인해 1970년대에 이르러 폐도(廢道)가 되었다. 이 길은 태화강에 산세가 급경사를 이루어 떨어지므로 높은 벼랑을 이루어있는 험한 곳이다. 옛날 어느 해 여름의 일이었다. 며칠 동안을 두고 큰 비가 쏟아져서 태화강은 홍수로 뒤덮혀 있었다.
이 때에 한 젊은 부부가 시집가지 않은 누이 동생과 함께 배리끝을 지나고 있었다. 강물은 길에까지 넘쳐 남창남창(넘실넘실)하고 홍수는 사납게 굽이치며 흐르니 길손들은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사나이의 뒤를 따라오던 시누이와 올케가 아차하는 순간 그만 발을 잘못 디뎌 강속(벼락소)으로 떨어졌다.
큰 비명에 놀란 신랑은 뒤를 돌아 보았으나 아내와 누이 동생이 한꺼번에 성난 탁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응겹결에 자기 앞에 떠내려 가는 옷자락을 잡아 겨우 건져보니 자기 아내였다.
이렇게 하는 순간 숨을 돌려 보았으나 누이 동생은 강 가운데로 떠내려가면서 두어 번 얼굴을 솟구치더니 그만 탁류 속에 휘말려 돌아오지 못하는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되고 말았다. 이 애처로운 일이 있은 뒤의 일이었다.
누군가가 지어 불렀는지 모르는 일이나 한 슬픈 노래가 불리어 졌다.
"남창 남창 배리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 죽어 환생하면
낭군님부터 정할래라."
이 노래는 지금까지 <모심기노래>로 개사(改詞)되어 널리 불리어 진다. 모내기철 해질녘에 구성지게 불러오던 이 노래의 출처인 벼락띠미(배리끝)가 이곳 벼랑(배리끝)이라고 한다.
화장산 도화
언양읍과 상북면에 걸쳐 있는 화장산의 이야기다. 신라 때의 일이었다 한다. 화장산 아래에는 어느 사냥꾼 내외가 두 남매를 기르며 살고 있었다. 그 때 화장산 위의 굴 속에는 한 마리의 큰 곰이 있어 이 산의 짐승은 물론 가까운 산의 짐승까지도 다 잡아먹고 있었다. 사냥꾼 내외는 이 곰을 잡으려고 활을 메고 창을 들고 산으로 곰을 찾아나섰다. 그러나 곰을 만난 그들은 불행하게 곰의 역습을 당하여 잡혀죽고 말았다. 그런데 집을 지키고 있었던 오누이는 밤이 되어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이튿날 새벽부터 화장산으로 들어가 부모를 찾기 시작하였다. 때는 엄동설한인데 북풍이 몰아치며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었다.
남매는 엄마와 아빠를 부르며 이리 찾고 저리 헤매다가 그만 눈 속에서 기진맥진하여 서로 부둥켜 안은채 가엾게도 얼어 죽고 말았다. 이렇게 불행하게 아들 딸이 죽은 것을 알게된 사냥꾼 내외의 혼백이 하도 가여워서 그 두 남매의 죽은 혼으로 하여금 한 그루씩의 도화(桃花 : 복사꽃)로 환생시켜 양지쪽에 피게 하였다. 이럴 때의 일이었다. 신라 서울에서는 임금님이 병이 들어 좋은 약은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하여 궁궐 안에는 온통 큰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 때 어느 의원이 임금님의 병상으로 나아가 아뢰기를「어려운 일이오나 복숭아 꽃을 따서 잡수신다면 병이 완쾌하겠나이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사자(使者)를 팔방으로 보내 도화를 찾게 하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남쪽으로 언양고을로 오게 되었다.
성의 남문에 사자가 이르렀을 때였다. 문득 머리를 서쪽으로 돌리는 찰라에 화장산에서는 이상한 서기(瑞氣)가 감돌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꽃을 바라볼 수 있었다. 겨울철에 이러한 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사자는 급히 말을 몰아 산으로 올라가보니 큰 바위굴 앞 양지바른 곳에 두 그루의 복숭아꽃이 곱게 피어 있었다.
그를 본 사자는 기뻐서 뛸 듯 하였다. 그래서 두 도화를 꺾은 사자는 말을 달려 궁성으로 들어가서 병상에 누운 임금에게「신(臣)이 언양(彦陽) 땅에 피어 있는 두 도화를 찾아 올리나이다. 드시고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정사를 돌보소서.」하였다.
그런데 이 도화를 먹은 임금의 병은 곧 씻은 듯이 완쾌하였다. 사자(使者)가 복숭아꽃을 꺾을 때 몇 송이의 꽃이 떨어졌다. 그 낙화에서 오빠의 정령(精靈)은 대(竹)가 되고 누이의 혼은 솔(松)이 되어 만고에 푸르고 있다 한다.
※ 注) 이 이야기는 1933년 7월에 언양(彦陽)의 김봉현(金鳳鉉)옹으로부터 채집한 것을「경상남도지」에 수록, 전해오던 것이다. 또 이것과는 줄거리는 같으나 다소 다른 이야기가 읍지(邑誌)에 수록되어 있어 소개한다.
세상에 전하기를 신라 때의 일이었다 한다.
임금이 병이 들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복자(卜者 : 점쟁이)에게 물었더니 도화(桃花)를 먹으면 병이 나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때는 겨울이라 도화를 얻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 한 신하가 말하되 남쪽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은 사람을 시켜 언양 땅 화장산에서 도화를 찾게 하였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다. 화장산 굴 가운데 한 포기의 도화가 피어 있질 않는가. 이를 바라본 사람은 굴로 달려갔으나 도화는 없었다.
단지 한 비구니(比丘尼)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는 비구니의 이름을 물어 보았다. 비구니는 이름을 < 도화 > 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 비구니를 데리고 왕에게 갔다. 도화를 바라본 왕은 크게 기뻐하며 3일간 법문(法文)을 들은 뒤 어느덧 병이 나았다고 전하여 온다. 이 도화의 이야기는 화장산의 연기설화(緣起說話)인 것이며 도화는 화장산의 산신(山神)일 것이다. 이 전설은「동국문헌록」에 전하는데 이로 인해 산의 이름이 화장산(花藏山)이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蔚山邑誌」이문조(異聞條)에 실려 전한다.
구수늪 이무기
언양읍 구수리(九秀里)는 구늪숲(九沼藪)이라고도 하며 또 구수(九藪)라고도 하던 곳이다. 숲(藪)과 늪(沼)이 많았다는 데서 나온 이름들이다. 원래 삼동면이었으나 1973년 7월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태화강의 상류가 이곳을 감돌아 흐르면서 홍수 때는 강심(江心)이 그 위치를 달리하기도 하여 여기저기 늪을 이루기도 하였던 곳이다.
조선조 숙종 때의 일이라 한다. 구수리 물막고개(九秀里 勿幕峴)에는 한 석굴이 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굴 속에는 한 마리의 큰 이무기(? : 이심이)가 살고 있었다. 용이 되려다 못되어 하늘을 오를 수가 없어 늘 심술을 부리고 있었다. 옛 속담에도 '용 못된 이무기'라고 심술이 난 이 이무기는 자기 굴 앞을 지나가는 가축이나 짐승들을 마구 잡아 먹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사람까지 해치게 되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야단들이었다. 이 변란은 마침내 관아에까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언양현감(彦陽縣監)이 이무기 퇴치에 나서게 되었다. 때는 숙종 41년(1715)의 일이다. 당시 언양현(彦陽縣)에는 모일성(牟一成)이란 기골이 장대한 현감이 재임하고 있었다.
그는 한 대(隊)의 포군(砲軍)을 거느리고 구수늪에 다다라서 군졸로 하여금 사격을 가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겁을 먹은 군졸들은 감히 굴 앞에 접근을 못하는 것이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비겁한 군졸들의 행동에 화가 치민 현감은 총을 들고 굴속으로 들어가서 일격에 이무기를 죽이고 만 것이였다. 이 모일성 현감은 본시 힘이 세고 몸이 장대하며 평소에 담력이 큰 위인이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마을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꾼들이 성시(成市)를 이루는 가운데 죽은 이무기는 밖으로 끌려나왔다. 꼬리는 석굴에 있고 머리는 구수연에까지 드리워졌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저렇게 크고 무서운 짐승을 잡은 모현감의 담력과 장대한 기골에 혀를 내두르며 놀랐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蔚山邑誌」이문조(異聞條)에 실려 전한다.
고함산
고헌산의 북쪽에 있는 경주시 산내면(山內面)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양(彦陽)쪽에 있는 고헌산(高窟山)을 속칭 < 고함산 > 이라고 한다. 산내면 대현리(大賢里) 중마을에는 문복산(文福山 : 1,015m)이라하는 높다란 산이 있다. 그런데 이 산에는 < 디린바우 > 라는 이름난 큰 바위가 마치 한 산봉우리처럼 높이 솟아 있어 이 바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높고 큰 층암으로 이룩된 이 바위는 위에서 아래로 드리워져 있다 하여 < 디린바우 > 라 불러온다.
이 디린바우는 드려지듯 험한 곳이므로 좀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석이(石耳)라 하는 돌버섯이 돌틈에 붙어 자라고 있어 마을사람들은 이것을 따서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이 디린바우에는 옛부터 지네와 거미들도 살고 있었다. 그 지네는 어찌나 큰지 채이(箕)짝만 하였고 거미 또한 서말지 소댕(솥뚜껑)만 하였다.
옛날 어느때 한 용감한 머슴(청년)이 있었는데 이 디린바우의 석이(石耳)가 몹시 먹고 싶었다. 그는 어느 날 길고 튼튼한 줄을 매어 바위의 아래쪽으로 내려가 석이를 찾아 따기 시작하였다. 인적이 닿지 않는 곳이니 석이가 많아 그저 온 정신이 버섯을 따는데만 팔려 바깥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다.
디린바우의 남쪽에는 멀리 고헌산이 자리잡아 그 위용을 자랑하듯 웅장하게 서 있다. 어떤 사람이 고헌산에 올라 나무를 한 짐 가득하여 지고 내려오다가 짐이 무거워서 어깨를 파고 드는 듯 하였다. 조망이 좋은 자리를 골라 짐을 받쳐놓고는 곰방대를 끄내어 담배 한 대를 부벼넣고 불을 당겨 한 모금 빨아 내뿜고나니 금시 어깨가 가벼워지는 듯하였다. 이때였다. 북쪽을 바라보니 디린바우에서 한 사람이 석이(石耳)를 따고 있는데 서말지 소댕만한 큰 거미가 사람이 매어 달려 있는 줄을 물어뜯고 있었다. 금시 소름이 오싹 끼치었다. 줄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영락없이 죽기 때문이었다.
나무꾼은 벌떡 일어서며 "보소 보소, 버섯 따는 사람아!" 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그는 버섯 따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 고함소리가 안들리는 듯하였다. 다시 목이 터질 듯 큰 소리로 "보소 보소, 버섯 따는 사람아! 보소 보소, 버섯 따는 사람아!" 하며 손나팔을 하여 고래고함을 지르기를 여러번 되풀이하니 겨우 그 사나이는 무슨말이 들리는 듯 이곳을 바라보며 손으로 응대를 하는 것이었다.
나무꾼은 손짓 몸짓을 하며 "거미가 줄을 끊는다! 거무봐라 거무를!" 하였다. 그제야 그는 말을 알아듣고 위를 쳐다보니 디린바우의 지킴(지꿈)인 왕거미가 나와 줄을 물어 뜯고 있지 않은가? 놀란 사나이는 급히 몸을 피하여 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고헌산을 < 고함산 > 이라 하였다.
나무꾼이 석이버섯을 따는 사나이를 위해 고함을 지른 산이라하여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화장산 염천
언양읍 화장산의 화장굴 앞에는 염천(廉泉)이란 샘이 있다. 바위 틈 사이에서 맑고깨끗한 물이 사철 쉼없이 퐁퐁 솟아나오는데 이를 일명 옥천(玉泉)이라고도 부른다.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부정(不淨)한 사람이 와서 이 물을 마시면 물이 탁해지고 샘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오며, 또 물을 더럽히면 말라져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진사 수오(睡鰲) 서석린(徐錫麟)의 시 <염천>이「읍지」에 전한다. →사회. 문화편(제영)참조.
세이제와 소부당
「언양읍지」에는 언양읍 화장산(花藏山) 위에 세이제(洗耳堤)가 있으며 세이제 북쪽에는 소부당(巢父堂)이 있다고 했다. 중국 고대 요(堯)임금 시절 은사(隱士) 소부(巢父)와 허유(許由)의 기산영수(箕山穎水)의 고사(故事)는 다음과 같다. 중국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동남쪽에 있는 기산(箕山)은 요임금 때의 고사(高士)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은둔했던 산이다. 허유(許由)는 본시 중국의 패택(沛澤)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어진 은자(隱者)였다. 그는 바르지 않은 자리에는 앉지도 않았고, 당치도 않은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의(義)를 지키고 살았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요(堯)임금은 천하를 그에게 물려 주고자 찾아갔다.
이 제의를 받은 허유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이렇게 훌륭한 천하를 잘 다스리신 요임금을 어찌하여 저같은 자가 이를 대신하여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저같이 볼품없는 인간이 어찌 광대한 천하를 맡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없이 기산(箕山) 밑을 흐르는 영수(穎水) 근처로 가버렸다.
요임금이 다시 뒤를 따라가서 그렇다면 구주(九州 : 중국 전토)라도 맡아 달라고 청하자 허유(許由)는 노여운 마음마저 들어 이를 거절하고 속으로 '구질구질한 말을 들은 내 귀가 더러워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아무 말없이 자기의 귀를 흐르는 영수(穎水) 물에 씻었다. 이럴 때 소부(巢父)라는 사람이 조그만 망아지 한 마리를 앞세우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며 그 광경을 보고 허유(許由)에게 물었다.
"왜 갑작스레 강물에 귀를 씻으시오?" "요임금이 찾아와 나더러 천하나 구주(九州)라도 맡아 달라고 하기에 행여나 귀가 더러워지지 않았을까 하고 씻는 중이요". 이 말을 듣자 소부(巢父)는 "하, 하, 하!" 하며 목소리를 높여 크게 웃는 것이었다. "여보, 소부(巢父)님 왜 그리 웃으시오?" 하고 허유가 민망스레 묻자 소부는 답하였다.
"평소의 허유(許由)님은 어진 사람이지만 숨어 산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렸으니 그런 산뜻하지 못한 말을 듣고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오. 숨어 사는 은자(隱者)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은자라고 하는 이름조차 밖에 알려지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법이오. 안 그렇소? 한데 그대는 여지껏 은자라는 이름을 은근히 퍼뜨려 명성을 얻은 것이오". 그리고서는 소부는 망아지를 몰고 다시 영수(穎水)를 거슬러 오라 가더니 망아지에게 물을 먹이며 말하였다. "그대의 귀를 씻은 구정물을 내 망아지에게 먹일 수 없어 이렇게 위로 올라와 먹이는 것이오" 뒤에 허유가 죽자 요임금은 기산(箕山) 위에 묻고 그의 무덤을 기산공신(箕山公神)이라 하였다.
이 두 고사(高士)의 절개와 지조를 이른바 기산지절(箕山之節) 또는 기산지조(箕山之操)라 하였다. 이것은 허유(許由)와 소부(巢父)에 관한 중국전설의 줄거리이나「읍지」가 단지 화장산(花藏山)에 세이지(洗耳池)와 소부당(巢父堂)이 있다 하였을 뿐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세이지(洗耳池)는 화장산 정상의 위렬공묘(威烈公墓) 서쪽(상북면 능산쪽)에 있어 청청한 물이 가득하며, 소부당(巢父堂)은 못안(池內里)쪽의 화장산 기슭을 이르고 있다.
또한 못안(池內里)쪽에서는 이 산을 부르되 화장산으로 보다는 <소부당산(巢父堂山)> 또는 <소부댕이>라 불러온다. 「谷」의 고훈(古訓)은「실」인 동시에「●」이기도 하여「●」의 차자(借字)로「堂·呑·頓·屯·丹」을 사용하여 왔으며, 직동리(直洞里)의 가고당(加古堂)도 실은 '가고골'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부당(巢父堂)은 소부의 전설이 깃든 '소부골'이란 말이다.
못안못의 잉어
상북면 지내리 남단에는 큰 못이 있다.
이른바 <못안못> 또는 <못안큰못>이라 불리우는 저수지다. 이 못이 있어 예로부터 그 못안쪽의 마을이름조차 <못안>이라 하고 이를 한문으로 <池內>라고 하였다.
조선 초기인 예종 원년(1469)에 편찬된「경상도속찬지리지」언양현조에 나오는 초산제(草山堤)란 못이 곧 이 못이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못은 그 옛날 농경사회에서 논 100마지기의 면적으로 축조한 것인데, 못둑에서 안쪽으로 바라보면 수초가 뒤덮인 못끝이 아득하다. 이 못의 잉어는 예로부터 유명했다.
사철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십여년만에 한번씩 가뭄이 들면 수굴(水窟)을 빼고 주야로 며칠간 고기를 잡는데 특히 밤에 횃불을 들고 불야성(不夜城)을 이루며 잡는 <못안못 잉어잡이>는 유명하며 그야말로 보기드문 장관이었다.
밤새 이전투구(泥田鬪狗)를 하다 새벽녘에 물가 개펄을 잠자코 바라보노라면 앙금이 사르르 가라앉은 물가에 붸겨나와 한가로이 노니는 대어를 발견하게 된다.
어린애 키보다 더 큰 누런 황금빛 잉어다. 채이(箕 : 키)만한 잉어 또는 짚단같은 잉어 등으로 표현된다. 이쯤이면 허연 모시적삼 차림으로 못둑에서 유유자적하게 장기 바둑을 두던 부잣집 노인네들이 군침을 흘리면 흥정을 해온다. 또 오래된 궁장어(민물뱀장어)는 등어리가 누르며 아가미에 귀가(뿔이)돋혔다 하여 찌꿈(터줏대감)이라고 잡아먹는 것을 금기시 했다.
바로 앞에는 복사꽃(桃花)전설이 깃던 화장산(花藏山)이 있고, 그 정상에는 조그마한 천지못이 있는데 중국 태고적 은사(隱士)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요임금이 그에게 천하를 맡아달라는 말을 했을 때 이를 거절하며 귀를 씻었다는 전설과 관련하여 이 못을 세이제(洗耳堤)라 하며 또한 이 산을 소부당산(巢父堂山)이라 별칭하기도 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못의 찌꿈 잉어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않는 이유는 워낙 큰못이라 수십년만에 드물게 마르는 가뭄뿐만 아니라 5리나 떨어진 정상의 천지못과 굴이 뚫려 그곳으로 내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달에 한 보름은 큰못에, 나머지 보름쯤은 천지못에 가 숨어 산다는 신비로운 설화가 있다.
이 어중왕(魚中王)인 찌꿈 잉어를 잡으면 그 해 농사는 대풍을 이루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운수대통의 행운도래(幸運到來) 속설(俗說)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워낙 신성시되는 날개돋친 이 괴어(怪魚)를 잡으면 집안에 불의의 액운이 미친다는 액운비래설(厄運飛來說)에 원인 모를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고로(古老)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는「야들아! 욕심이 많으면 실물을 감한데이, 그냥 보내줘라. 조금만 작았으면……」하며 못내 아쉬움을 남긴채 아깝지만 그냥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비록 어대(魚代)는 치렀지만 천재일우(千載一遇)로 간신히 건져낸 젊은이들의 항변속에 온 못이 떠들썩한 가운데 아쉬움의 곰방대만 연신 빨아대던 그 노인의 세월의 나이테와 여유자적한 살생의 예지(叡智)는 지금도 이 지방사람들에게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상북면 지내리 최흥락(崔興洛) 구술(口述)>
돌빼기
언양읍 반곡리에서 대곡리로 흐르는 반곡천(盤谷川)의 하류로 고하마을 앞에서 동남쪽으로 산간계곡을 따라 약 3㎞쯤 굽이굽이 휘돌아 반구대에서 한실로 흐르는 대곡천(大谷川)과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계곡을 고하골(庫下谷) 또는 사학골(死鶴谷)이라 부른다. 지금은 그 하류가 1960년대 중반 사연댐의 축조로 수몰되었다.
이 돌빼기(돌배기)는 '돌박이'에서 나온 말로 <-박이>는 일부 명사 밑에 붙어, 그것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임을 나타내는 접미사(接尾辭)다. 예컨대 점박이, 자개박이, 조산(造山)박이, 살대(箭竹)박이, 장승박이, 솔(松)박이 등이 그것이다. 또 동부리에서 상북면 못안(지내리)으로 가다 능곡 앞에서 내곡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 길목에는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외딴 주막 하나가 있었다.
못안 및 새터(신화리) 장꾼들의 석양의 유일한 쉼터가 되었는데, 세칭 <돌배기주막>이라고 했다.
이 돌배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조선조 연산군 시대(15세기 말엽) 원래 토성(土城)이었던 언양읍성을 석성(石城)으로 한창 개축(改築)하고 있을 때였다.
성에 쓰이는 성돌을 운반하기 위하여 어느 한 역발장사(力拔壯士)가 바위만한 큰 돌들을 회초리로 몰고 오던 중 이곳에 당도하자 성내(城內)에서 성을 다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만 그 자리에서 돌몰이를 멈추었다. 그 때 그 돌들이 남아 사방 흩어져 땅에 박혀 돌배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경지정리사업으로 지금은 그 돌들이 모두 없어졌다.
사학골
언양읍 반곡리에서 대곡리로 흐르는 반곡천(盤谷川)의 하류로 고하마을 앞에서 동남쪽으로 산간계곡을 따라 약 3㎞쯤 굽이굽이 휘돌아 반구대에서 한실로 흐르는 대곡천(大谷川)과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계곡을 고하골(庫下谷) 또는 사학골(死鶴谷)이라 부른다. 지금은 그 하류가 1960년대 중반 사연댐의 축조로 수몰되었다.
고하마을에서 동남쪽인 반구대로 가는 골짜기 왼쪽(계곡의 북쪽) 산이 풍수지리설로 볼 때 흡사 학(鶴)의 형국이라 하여 사학골(死鶴谷)이라 하였다.
이 산은 왼쪽 날개가 없는 학의 형상이라, 학이 한 쪽 날개가 없으니 자유롭지 못하여 죽은 학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 곧 사학골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민들이 흔히 부르는 <사낙골> 또는 <산악골> 등으로 와음(訛音)된 것이다. 이 사학골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옛날 이 부근에 미영(목화)이 잘 자라는 밭이 있었는데 이 밭에서 어느 해 젊은 각시가 목화를 따다 '각시골'로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마을사람들이 동원되어 찾아보니 '묵은등(嶝)'에서 사람을 잡아 묵(먹)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 묵은등에 가면 작은 묵묘(陳墓)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그 때 그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 사람들의 뼈를 모아 묻어 둔 묘라고 한다. 이처럼 사학골에는 작은 계곡과 작은 산등이 많다.
고헌산 우뢰돌
상북면 고헌산 북쪽 산기슭 중앙에는 <우뢰들>이라 불리우는 넓은 돌들긍(岩田)이 있다. '돌등긍'이란 큰 바위덩이가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인해 깨어져서 산의 계곡을 덮어 있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 돌밭을 말한다.
덕현리 삽재마을 광바우(廣岩)를 옆으로 휘돌아 경주 산내(山內)로 넘어가는 외항재(瓦項峴)에 오르면 바로 앞 산(고헌산)에 정면으로 이 <우뢰들>이 눈앞에 다가온다.
학교 운동장만한 큰 돌등긍이 가운데 능선을 두고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쪽의 것이 더 넓다. 이 돌들긍 밑으로 사철 물이 흘러 '우르릉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우뢰소리같다 하여 예로부터 <우뢰들>이라 하였다.
산세가 아주 가파르고 험하며 여느 돌들긍보다는 특이하게 이곳에는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사지(死地)이다.
가파른데다 얼기설기 어지러이 쌓여 있는 이 돌밭(石田)에는 한 발짝만 내디뎌도 와르르 무너지므로 산짐승마저 피해간다는 곳이다. 이와같이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라 지금은 주변의 수목이 점차 번성하여 그 면적도 많이 줄어들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우레들 가운데는 큰 돌샘(石井)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산칼치가 살고 있다고 한다.
어른 서너 발쯤되는 긴 산칼치는 원래 바다에 사는데 가끔 육지에 올라올 때는 시퍼런 빛을 내며 이곳에 들어와 서식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바다로 돌아가는 등 수륙(水陸) 양서동물(兩棲動物)이라 한다. 그놈이 지나가면 부근의 초목은 시들고 근동(近洞)에는 그 피해로 그해 농사도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무하러간 머슴이나, 소먹이러 간 아이들, 봄철에 나물캐는 아낙네들이 잘 모르고 이곳에 근접하면 멀리서 마을 노인네들이 못들어가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러한 <우뢰들>의 전설은 반대편인 동남쪽(언양읍 다개리쪽) 정상부근에 있는 <용새미>와 함께 고헌산의 신비로운 2대 전설로 남아 있다.
까꾸당
언양읍 직동리 신화(새터)마을 북쪽, 즉 평리 고중마을에서 상북면 지내리 쟁골(齋宮谷)로 넘어가는 중간에 깊숙이 들어 앉을 골짜기를 예로부터 <까꾸당(加古堂, 加高堂)> 또는 <까꾸댕이>라고 불렀다. 이곳에 있는 못이름도 까꾸당못(加古堤)이다. 이 까꾸당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남아 있다. 먼 옛날 경상도 대구 부근 어느 고을에 최씨가 살고 있었다. 본래 최씨는 양반의 가문에서 태어난 뼈대있는 집안이었으나 윗대부터 워낙 가난하여 대구지역으로 이사를 해 양반들이 집단으로 사는 부자동네에서 상놈의 행세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꾸려갔다. 주로 양반집의 농사일 , 심부름, 묘지기, 대소사 치다꺼리, 가마꾼 등 힘들고 천한 일을 도맡아 하였는데 천성이 부지런한 그는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제법 재산을 모았다. 어느해 고향에 찾아가니 고향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고, 특히 친척들은 멸시를 더 하였다.
상놈의 행세를 한다고 족보에도 이름을 빼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돌아와 자기집 근처에 큰기와집을 다시 짓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상놈이 양반행세를 한다고 주민들이 더욱 싫어하고 괄시하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했다. 한번은 마을사람(양반)들이 동회(洞會)를 열어 객지에서 굴러 들어온 상놈, 따끔한 맛을 보인다면서 마을사람들에게 끌려 나가 몰매를 얻어맞기도 하였다. 고향에 가면 상놈행세하여 가문 망신을 시킨다고 친척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객지에서는 뜨내기 상놈이 돈 좀 있다고 겁 없이 양반행세한다며 갖은 멸시와 고초를 당하니 원한이 맺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곰곰이 생각 끝에 가족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객지에 가서 자유롭게 살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갈곳을 물색한 곳이 지금의 언양읍 직동리와 상북면 지내리 사이에 있는 두리봉이었다. 이 두리봉은 지내리(못안)에서는 청룡등(靑龍嶝)이라고 한다. 즉 동래정씨 못안 입향조의 묘소가 있는 왼쪽 봉우리이기에 좌청룡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이곳에 삶의 터전을 정하고 집을 지었다. 산봉우리에 외딴 집을 지은 것은 남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고 또한 양반들의 횡포에 대한 무언의 항거이기도 하였다. 큰 기와집을 짓고 방안에서 내려다보니 속이 시원하였다. 동남으로는 직동들판이 한눈에 들어오고 서남으로는 못안의 두 들판(신리와 대리)이 자기집을 쳐다보는 듯했다. 집을 짓는 동안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데 하루는 어느 과객(過客)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매우 부자인 모양이지." 하면서 몇 발자국을 걸어가다 돌아보며 하는 말이 "저 집에 다니는 길은 동쪽으로 있어야 하지 다른 곳으로 내면 안되는데?" 하면서 지나갔다. 이 말을 들은 최씨는 길을 동쪽으로 내었다. 산길이 너무 가파러서 말등에 한 사람이 타고 올라가도 땀이 젖을 지경이었다.
따라서 곡식을 실어다 나르기가 여간 고역(苦役)이 아니었다. 아랫사람의 말대로 경사가 덜진 집뒤 골짝길을 새로 내어 그곳으로 다녔다. 이제는 하인도 들이고 제법 양반행세를 하며 이웃과도 사귀어 자기집으로 찾아오는 친구도 생겼다. 어느날 친구들을 초대하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흥겹게 놀다가 술이 좀 취하자 근본을 잊지 못하고 그만 말끝마다 상소리가 나왔다. 그후 자주 만나 상종(相從)을 하다보니 본색이 드러났다. 이웃 사람들이 최씨를 상것이라고 낮춰보며 데리고가 뭇매를 때렸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대구지방으로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높은 산 봉우리에 집은 있으되 여기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래등같은 기와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 마을사람들이 이 집을 가리켜 가고당(加高堂)이라고 하였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이 변하여 <까꾸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때 그 기와집의 주춧돌이 그 자리에 있으며 기왓조각 등이 흩어져 있다. <언양읍 직동리 신화마을 정원모(鄭元謨) 구술(口述)>